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72898
4년 전 이즈음이었을 것이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엄마가 겨울 한파를 이기지 못하고 또다시 쓰러졌다. 처음엔 왼쪽 뇌혈관이, 이번엔 오른쪽 뇌혈관이 막혔다고 했다. 그날 이후 엄마는 요양병원으로 들어가 4년을 보냈고, 얼마 전 중환자실에서 한 달을 견디다 힘겨운 투병을 거두셨다. ‘돌아간다’는 말이 얼마나 애가 끓는 말인지 사십 중반을 넘어선 지금, 세상에서 한 번뿐인 이별을 하며 마음에 눌러 넣고 있다.
엄마가 병원에 있는 동안 나는 병원비와 생활비를 둘 다 감당해야 했다. 그러니까 4년 전 이즈음 내겐 매달 병원비를 메꿀 돈이 절실히 필요했다. 청탁 하나 없는 소설을 접고 평일엔 교정 외주 일을 했고, 주말마다 웨딩홀에 나가 그릇을 나르는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도 이즈음이었다. 하루에 천 개의 그릇을 나르며 손목이 나갔고, 병원비는 여전히 쌓였으며, 소설을 쓸 여력은 남아 있지 않았다. 그때 조영관 문학창작기금 공고를 봤다. '평등·평화를 사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지향하는 숨은 문학인을 찾고, 그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했다'는 문학창작기금의 취지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읽었다. 마감 하루 전이었다.
언제 샀는지 기억나지는 않지만 나는 그의 시집을 가지고 있었다. 책꽂이에서 그 시집을 꺼냈다. 그의 무덤 위에 놓여졌다는 유고시집 <먼지가 부르는 차돌멩이의 노래>(실천문학 펴냄, 2008)는 그렇게 내게 들어왔다. 그는 먼지가 된 시인이었고 차돌멩이를 노래하는 시인이었다. 어둡다가도 밝고 따뜻하면서도 서늘한, 중심이 뿌리부터 어지럽게 흔들리는 것이 사랑이라고 노래한 시인이었다. 제비꽃의 꿈이 다칠라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웅크려 보기만 하는 시인의 모습이 시집에 오롯이 담겨 있었다.
그의 삶의 내력을 훑어보았다. 전남 함평, 학다리 중학교, 성동고등학교 문예반, 경영학과에서 영문과로 전과, 출판사 일월서각 입사, 박영근 등과 학습 모임, 인천 지역 노동운동, 용접을 배움, 동미산업 노조 위원장, 구사대에 갈비뼈가 부러지는 폭행 당함, 영종도의 아스콘 생산 기계 설치 작업, 통일문제연구소 <노나메기> 창간호에 '산제비' 발표, 해남 농가에 6개월간 머물며 소설을 씀, 수원의 쪽방에 살며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노동공동체인 '햇살공동체' 설립, 경춘 교각 점검대 설치 도중 실족하여 실려간 병원에서 간암 판정, 5개월도 안 되어 투병 중 영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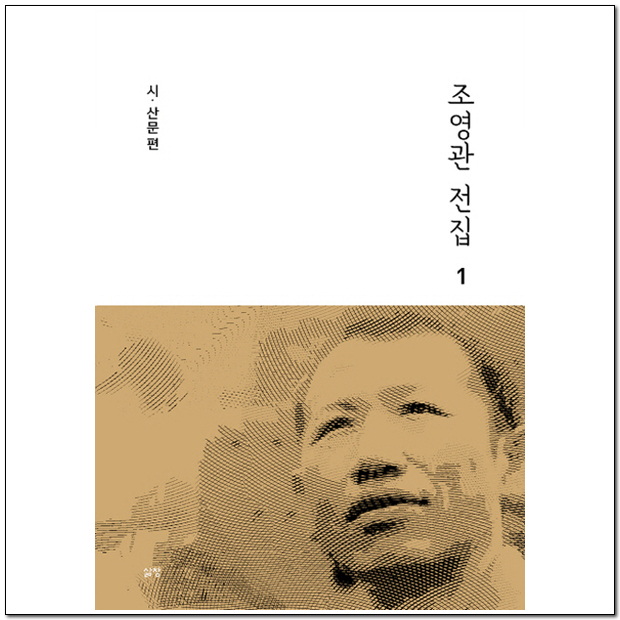
ⓒ삶창
살아생전 그가 발표한 시는 백기완 선생님이 "이런 게 진짜 시"라고 한 '산제비'를 포함해 고작 16편이 전부였다. 그가 노동자로 살며 소설도 썼다는 구절이 못처럼 박혔다. 나는 파일을 뒤져 소설 두 편을 이메일로 투고했다. 마감 한 시간 전이었다. 한 달 뒤 그가 돌아간 지 여덟 해가 지난 이월의 마지막 주, 나는 백기완 선생님이 있는 자리에서 꽃이 부리를 열어 내뱉는 말, "고맙습니다"라는 수상 소감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뇌경색으로 오른쪽 왼쪽 핏줄이 우느라 입이 닫힌 어미를 보고 오는 길입니다. 핏줄이 울면 목구멍에 힘이 빠진다는군요. 목구멍에 힘이 빠져 물을 넘겨도 사레가 들고 밥알을 넘겨도 기침부터 터집니다. 침 한 번 삼키는 일이, 소리 내어 이름 한 번 불러주는 일이, 칠십 평생 몸을 비우고 채우는 꽃부리의 고된 노동 같습니다. 어미의 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 어미는 침을 흘리며 하루 종일 만들어낸 다섯 글자를 내뱉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미의 목소리에서 향이 퍼지더군요. 꽃이 부리를 열어 내뱉는 그 향으로 이 어둠을 버틸 힘을 얻습니다. 노동의 핏줄을 따라 시를 피우고, 흔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바다와 하늘을 용접하던 시인의 길에 동행합니다. 너와 나를 이어붙이는 "꼬스름한" 용접 향이 퍼지는군요. 시인이 이어붙인 그 길 위에서 현실을 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부딪치겠습니다."
― '꽃부리의 노동으로' 수상 소감 중
두 해가 지나 그의 10주기 기념식에서는 두 권의 책이 보태졌다. 한 권은 미발표 시와 산문을 찾아 담았고, 또 한 권은 그의 소설로 총 1500쪽에 달하는 전집을 발간했다. 나는 그가 생전에 썼던 소설의 책임편집을 맡았다. 원고지 2000매가 넘는 장편소설과 중단편소설은 총 3000매에 달했다. 그뿐인가. 그가 소설을 쓰기 위해 공부한 흔적은 파일 곳곳에 남아 있었는데, 특히 나를 사로잡은 것은 소설의 분량 못지않은 사전이었다. 그는 ‘문학 공부 자료’ 파일에 모국어 낱말 모음, 분야별 언어 모음, 서술에 대한 연구, 의성어·의태어 연구, 각 지역의 사투리 모음 사전을 모아놓고 있었다. 그 사전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전집에 실린 800쪽에 달하는 그의 소설을 보면 알 수 있다. 평론가 고명철은 그 방대한 소설에서 이런 문장을 뽑았다.
"삶이란 낮아서, 한없이 낮아서 축축하고 비릿한 거라요."
― '절집 고양이' 중
남도 가락을 닮아 한번 뽑아내면 마침표를 찍을 수 없는 노래와 같은 작가. 그의 시는 잡지에 실리기에는 길었고, 그의 소설은 한 권의 책에 담기기에는 마침표가 없었다. 그가 시를 통해 하늘과 바다를 용접하려 했던 것처럼, 살아생전 소설 한 편 발표하지 못한 소설가의 운명은 미완의 것으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 왔던 그의 생을, 안타깝게 돌아간 삶을, 미완의 문학을 기려 이어가는 것, 조영관 문학창작기금은 그렇게 수혜자를 찾아나선다. 그가 5년 동안 쓰고 세 차례 퇴고를 한 후에도 "어지러운 글의 가지를 치고, 시점과 줄거리까지 검토하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다"라고 밝힌 2000매의 장편소설 <철강수첩>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소설이다. 그것은 한국사회의 노동의 그늘에서 꿈틀거리는 누군가에 의해 이어지지 않을까. 2020년 조영관 문학창작기금의 수혜자를 기다린다.
